주간 기독교 www.cnews.or.kr
두 글자로 신학하기
달란트 비유의 불편한 진실...
환대 7
구미정 (기사입력: 2012/09/14 11:00)
초기 기독교 가정들은 ‘세 가지 보물’을 항상 구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늦은 밤 혹시 방문할지 모를 낯선 손님을 위해 ‘양초, 마른 빵, 여분의 담요’를 마련해두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러한 환대 문화를 오늘날 대도시에서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세례를 거친 나라들에서 환대는 오로지 상업적인 공간에서만 잔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종교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매몰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거래, 곧 순환적 경제라는 테두리에 갇힌 사이비 환대를 구원하는 길은 그것을 단순한 나눔이나 친절, 베풂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 환대는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비가 환대의 밑절미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의 정의는 철저히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기 마련이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무능력한 사람이 덜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통용된다. 가난한 나라의 유색인 이민자들을 백안시하여 급기야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하는 부자 나라의 극우적 광기는 이러한 정의관의 비뚤어진 표출이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그간의 해석이 세상의 정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오독되어 온 것은 생각할수록 불편하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세 명의 종들에게 맡겼는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 중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곱절씩을 남겼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 속에 그대로 묵혀 두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정산할 때, 곱절의 이익을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지만, 재산을 전혀 불리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비난도 모자라, 그마저 있던 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 가진 이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다. 본문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마태복음 25:29)이라는 협박 비슷한 분위기로 끝이 난다.
사실 1달란트도 적지 않은 액수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1달란트가 되니, 15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예수의 말에서 달란트를 글자 그대로 ‘자본’으로 번역하면, 이 본문은 무한경쟁적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기에 딱 알맞다. 부자의 사업 수완과 자본 축적을 신의 축복으로 둔갑시키고, 가난한 자의 빈곤을 그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누가복음 6:20; 마태복음 5:3)라는 예수의 산상수훈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해석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돌려 해석하는 것인데, 그 또한 능력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마뜩찮다.
내가 보기에는 달란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깨달음’ 정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예수의 도道를 많이 깨닫고, 또 자신의 깨달음을 남들에게 나누어주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신화에 갇혀 깨달음을 방치한 사람은 수행을 게을리 한 탓에 도통道通할 수가 없다는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예수의 도, 곧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도를 얼마나 따랐느냐 하는 것이다.(마태복음 6:33) 세상의 정의와 달리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심에 기댄다. 세속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그네, 떠돌이의 권리가 ‘우선’ 존중되고, 그들의 필요가 ‘우선’ 채워져야 한다. 이 정의는 세상 법의 질서를 벗어난 것으로, 보상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가 아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으면, 누구나 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환대는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기 짝이 없는 삶을 신의 온기로 채운다. 삶의 양식으로서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으로서 환대가 어찌 시대나 주거환경에 좌우될 수 있을까. 용산참사를 기억하며 촛불 하나를 밝히는 행위, 한양주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터를 ‘마을’로 가꾸는 행위, 이런 작은 몸짓들이 모여 각박한 일상을 환대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닐까.
나부터 당장 삶에 찌든 우거지상을 펴고 모든 낯선 이를, 우주만물을 환대하는 얼굴이 되어야지. 성형수술 따로 있나, 보시가 별건가. 눈길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 발길 하나에 남을 뜨겁게 환대하는 마음이 담길 때, 신이 지상에 다녀가신다. 나를 도구삼아 기적을 행하신다.
☞ 개천절에 즈음하여...박사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찾아뵈세요^^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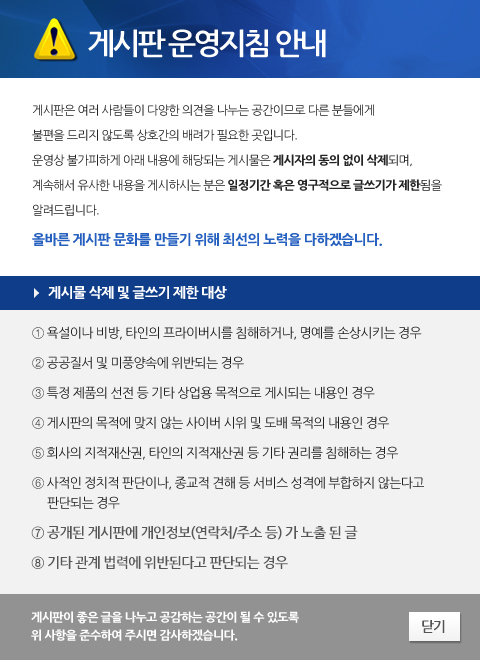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