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애와 나는 열아홉, 단짝이었어요. 떡볶이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별것 아닌 고민에 밤을 지새우던 시절이었죠.
"우리 나중에 할머니 돼서도 같은 요양원 가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아픈 가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물둘, 꽃 같던 나이에 그 애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고였다고, 운명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제 시간은 그날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그 애의 영정 사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나 괜찮아, 너라도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제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입니다.
사는 게 바빠 잊고 지내다가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나 편의점의 달콤한 딸기우유 향기에 그 애가 불쑥 나타나요.
"야, 너 왜 혼자 늙어? 치사하다!" 하고 장난스럽게 등을 때릴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보고 싶은 나의 친구야. 네가 머물던 그 찬란한 계절 속에 나는 여전히 살고 있어.
눈물이 흐르지만, 이제는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해. 너무 일찍 가버린 네가 아니라, 너와 함께했던 그 눈부신 시간들만 기억할게.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꿈에서라도 한 번만 들러줄래? 우리 그때처럼 실컷 웃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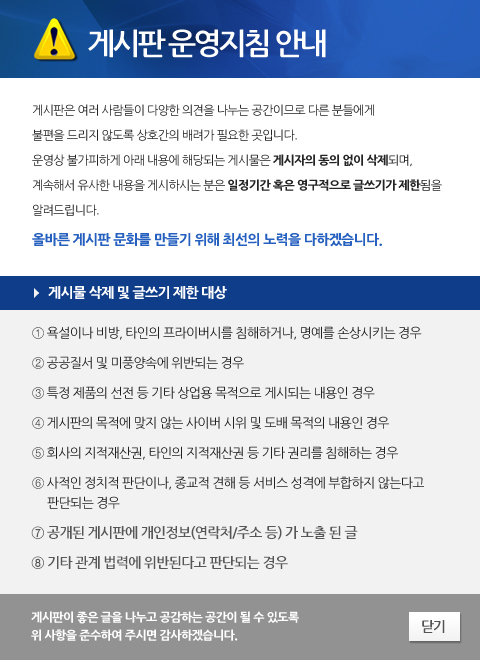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친구찾기] 친구 찾습니다.
올리비아빌라여왕
2026.01.26
조회 31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