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 부터 엄마는 맏딸인 내가 참 의지 되셨나보다.
집안 일이라면 폭풍이 휘몰아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을일을
우선으로 여기셨던 아버지의 부재를. 가슴 빼곡
원망과 하소연으로 메꾸어 오신날이 많았다.
그렇듯 겨울이면 방방마다 군불을 지펴야 했으니
그 많은 땔감을 해오는 일도 엄마가 도맡아 하셨다.
그럴때 마다 꼭 엄마는 나를 데리고 가셨다.
가끔은 친구들과 놀고싶어 따라가기 싫다며 떼를 쓰면
"느그엄마, 호랭이 한테 물려가도 괘안나?
니라도 따라가이 훨씬 덜 무서운데..."
하시며 갈수록 말꼬리가 약해지셨다.
어른들 흔한 얘기로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쪼맨한 내가
서까래 같은 큰 의지였던 이유를 진작에 헤아리질 못했다.
바람불면 '휑'하고 날아갈것만 같은 가랑잎 같은 여인의 몸으로
고목들이 창창 우거진 '범 소굴'같은 산골짜기를 헤쳐가며 장작을 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였음이니라.
그때 내 나이 일곱살, 지게를 진 엄마 뒤를 따라 산골짝을 타면
작은 바람에도 바스락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두드러기 일듯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내색 않으시던 엄마도 급기야는 무서움에 전율이
느껴오는지 일부러 큰소리로 헛기침을 하셨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쿨럭쿨럭' 엄마 소리보다 더 크게내면
잠시나마 무서움은 저쪽으로 달아나곤 했었다.
사람들이 진입하기 좋은쪽은 동네사람들의 손길이 이미
탄 곳이라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했다.
이른 아침 숫돌에 갈은 서슬 시퍼런 낫으로 엄마는
나무둥치를 하나씩 패기 시작했다.
편편한 자리에 지게를 내려두고 닥치는 대로 쉴틈도 없이 나무들을
지게에 얹으셨다.그리고는 메아리가 지도록 툭닥툭닥 힘차게
나무둥치를 내리 치셨다. 혹여나 호랭이라도 나올라치면 나무패는
소리에 놀라 아예 근접조차 못하게끔 머리 쓴 방패막이야말로
엄마만의 간절하고도 심중한 수단이었다.
그 당시는 '면허지'라 불리는, 면사무소에서 땔감을 사용하는 나무는
아무리 베가도 벌금을 메기지 않는다는 허락이 내려졌기에, 집집이
많이만 해가면 장땡이였다. 올때마다 엄마는 장작을 꾹꾹 눌러가며
지게가 높으도록 나무를 실으셨다.자주 드나들기 힘드는 일이니 걸음 한김에
어떻게든 더해가려는 모진 욕심이고 삶의 끈질긴 애착이었다. 엄마따라 나도 손을
손을 놀리는 법이 없었다. 고사리손으로 나마 낫질한 가지들을
수북히 모아두면 엄마는 "아이고 기특도 해라. 많이도 했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허술한 낫질이니 손가락에 피나는 일은
다반사였다. 엄마가 걱정 하실까봐 얼른 풀쐐기를 잡아당겨
피나는 자리에 챙챙 묶었다. 잠시 조용해진 나를 눈치채시곤
"또 손가락에 피나나?'하시면
"개안타,엄마!"하고 고개를 돌려 엄마 얼굴을 슬쩍 보면 안쓰럽다는 표정이
역력 하셨다
"니라도 따라 와주께내 엄마가 덜 무섭다 아이가.." 어리고 쪼맨한
나도 인간이라고, 산에 갈 적 마다 혹부리처럼 달고 가시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 마음을 살뜰히 알기에 투덜대면서도 한 번도 빼먹질 않고
엄마 뒤를 바둑이처럼 졸졸 따라 나섰다.
흰쌀밥은 아예 구경도 못하던 시절이라 봄이면 엄마는 약초를 캐다 파셨다.
그런날도 꼭 나를 데리고 가셨고 '백출' 이라는 약초도 엄마덕에
일찍부터 배웠다. 뿌리가 깊게 박힌 백출을 캐는일은 쉽지 않았다.
괭이로 흙을 파헤치고 깊게 박힌 뿌리를 힘껏 잡아당기다 보면
휘청거리며 뒤로 나자빠지는 날도 허다했다.
그래도 한 뿌리 한 뿌리 모아지면 오일장에 나가 보리쌀도 사고
눈깔 사탕도 사고 ,달근한 엿 바꿔먹는 재미에 부지런히 엄마를 도왔다.
약초를 캐는날도 나무를 하는 날 만큼 무서웠다. 한 곳에 약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살펴가며 다녀야 했기에
미끄러지는 날도 세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나도 옷자락에 쓱쓱 문지르면
그것이 치료였다, 집에 와서도 상처에 바를 연고도, 약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엄마와 함께했던 유년시절은 언제나 즐거웠다.
내 몸집 보다도 더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따슨 엄마 손잡고
쫄래쫄래 오일장으로 가던 날이 그토록 행복했다.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조경수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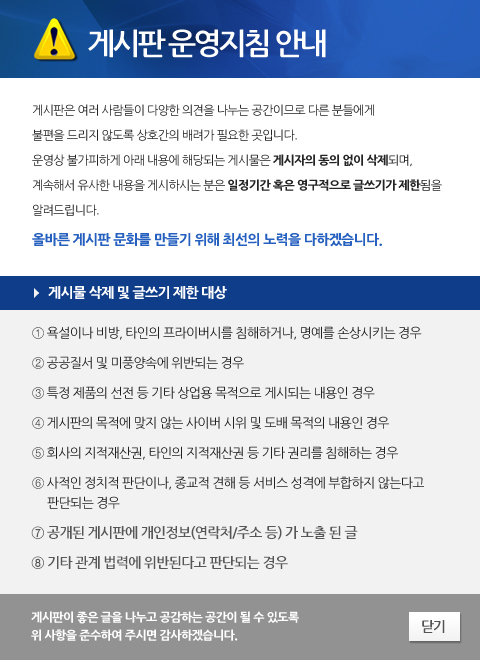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