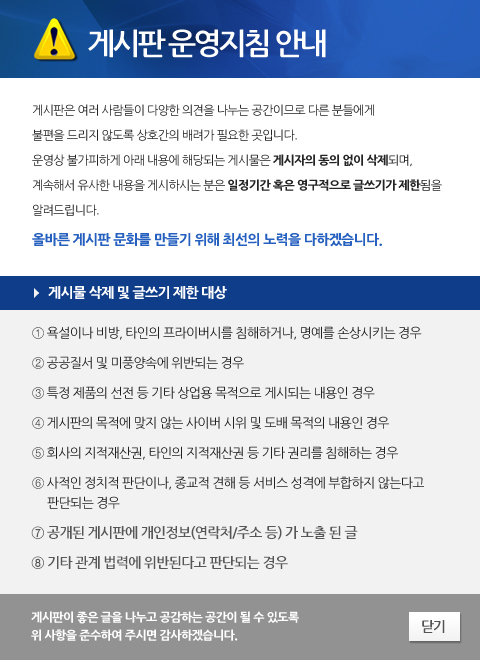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창 밖의 눈이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이정균
2001.02.24
조회 22
입춘이 지나고 봄꽃이 점점 만개하려고 있는 요즘.
창 밖을 보니 또 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군 제대 후 다음 학기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정균 입니다.
저의 글을 쓰기에 앞서 우선 저의 반성부터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글은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돼는데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고 있는 20대의 젊은이인 제가 그동안 노약자석 자리를 잡고 앉아 그 자리의 주인들이 승차하셨을때도 자리 양보를 거부한 채 감은 눈을 뜨지 않았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론 두 번 다시 그런 철부지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린 이유는.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저 같은 이기주의자들로만 꽉 차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던 현장을 글로 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학원 수강을 끝마치고 지친 몸을 지하철에 의지한 채 귀가를 하던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여느날과 다름 없이 꽉 찬 승객들로 가득찬 지하철은 덜컹덜컹대면서
한 정거장씩 계속 옮기고 있었는 데 제 반대편에서 어림잡아 여든이
넘어 보이시는 한 할머님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 말씀의 골자는 당신의 남은 여생을 기탁할
서울에 있는 한 작은 암자를 찾아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종이
쪽지에 대략적인 주소만 적어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고운 백설이 잔뜩 내려앉은 그 분께선
당신 평생동안 이번 서울행이 초행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숨가쁘게 정거장을 스쳐 달리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종이쪽지를
펼쳐가면서 열심히 길을 물으셨지만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로
발디딜틈이 없는 그 안에서 할머님의 행동에 반가운 눈길를 보내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었고 되레 복잡한 퇴근 시간대에 귀찮게 한다며
할머님께 곱지 않은 시선만이 계속 꽂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님은 종이에 적혀 있다는 돈암역에서 힘 없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차했지만 개찰구로 빠져 나가는 수십개에
이르는 계단 부터가 시련이었습니다.
한참동안을 그 계단을 응시하던 할머님께선 아주 천천히 바리 바리
가지고 온 당신의 짐을 챙겨들고 힘들게 하나씩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빨간 명찰을 단 군인 한명이 뻔쩍
그 할머님을 업더니 개찰구를 빠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은 몇번이나 당신의 손자뻘 되는 군인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셨고 젋은 상병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할머님 손에 꼭 들려
있었던 약도를 건네 받고는 할머님과 함께 역을 빠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전 그래도 그곳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두 사람과 함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서 그 군인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내리는 비를 그냥
온 몸으로 다 맞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암자를 계속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날은 계속 어두워 오고 비도 내리고 있었는 데 택시 기사들조차
고개를 꺄우뚱 거리는 그 분의 안식처를 알려주는 구세주는 도통
나타나 주질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상병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생면부지인 할머님
손에 드링크 한 병까지 쥐어주고는 계속해서 사방 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마침 그 곳을 지나던 그 절의 신자를
아주 우연히 만날 수 있었고 할머님은 그 신자의 친철성때문에
무사히 택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상병과 합장을 주고 받으며 비록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도 깊게 배어버린 그 큰 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못내 아쉬우셨던지 할머님은 그 군인의 손에 빨간 사과 두알을
안겨주셨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꼭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손을 맞잡은 채 몇번이나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 까까머리 군인도 차 뒷문을 통해 “젋은이 꼭 성불해”라고 외치시는 할머님께 연신 손을 흔들며 건강하시라는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의 눈가도 물기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전 그 상병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어디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이 저를 또 한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북 칠곡에 사는 그는 휴가 나와서 누나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누나가 사는 동네외엔 서울길은 완전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먼곳을 찾아온 할머님을 외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돼 비록 자기도 지리에 서툴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찾으면
조금이라고 더 빨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하차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핀 담배 한 개비를 끝으로 그는 다시 지하철 역으로 불이
나게 뛰어내려갔고 전 그의 멋진 뒷모습에서 정말 오랜만에 찐한
사람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나눈 담배 한 개비의 달콤한 연기가 아마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짧고 보잘 것 없는 이 글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못내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참한 마음이 복원될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세상 부탁드립니다.
이만 저의 글 마치겠습니다. 이 정균 올림.
김정민의 이젠 다시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