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휴대전화 벨이 울려 받았습니다. ''내 갈비뼈''의 가라앉은 목소리 였습니다.
"정훈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어쩌죠?"
"그래? 어쩌긴 빨리 가봐야지."
저는 울산에서 ''영남 알프스''의 한 봉우리인 가지산을 넘어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가지산은 말그대로 가을의 절정 이었습니다. 만산만홍 이라던가요, 온갖 색으로 채색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 단풍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고울까?''
어처구니 없게도 친구 모친의 부음을 듣고 가는 내 마음에 가을산을 감상할 여유로움이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어 생각을 흩으려고 애를 쓰며 열심히 갔습니다.
상가가 저만큼 쯤 보일 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조화라든가 만기가 보일 듯도 하다만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 궁금증만 더해, 의아해 하면서 집안에 들어서니, 아니 이런 일이...
돌아가셨다는 어머님께서 방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가시겠다''고 친구에게 전화를 형수님이 하셨는데, 친구는 저에게 ''그만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그 날 어머님의 깡마른 손을 잡고 옛날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서 두런두런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께서는 가물가물한 기억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무어라 무어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마치 아들의 손인양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놓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어머님의 기억속에 제가 드린 몇마디의 말이 남겨있을 것입니다.
"어머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저세상에 가시거든 온갖 시름,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시고 재미있게, 아름답게 지내세요."
희비가 엇갈린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섶엔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불을 태운 빠알간 단풍잎들이 주단을 깔아 놓은 듯 펼쳐저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오신 어머님처럼...
하루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의 햇살이 남쪽으로 난 창문을 찾아 올 즈음,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친구야, 미안타. 자네가 울엄마 마지막 임종을 해주었네, 참으로 고맙다. 내 대신자네가 아들 노릇을 해주었네,정말 고맙네."
"친구야, 무슨 소리야?"
"자네가 다녀가고 나서 몇시간 뒤에 운명하셨네, 이사람아."
"정말인가?"
"그렇다네, 울엄마가 아마 평소에 좋아했던 자넬 보고 가시려고 그러셨나보이."
"......."
다시 달려간 친구의 집에는 이제는 운명을 달리하신 어머님의 영정에 검은 리본만이 선명하고, 웃고 계시는 어머님의 영정에서 마치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왔는가?'' 하시는듯 한 평소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생의 마감을 하시려고, 못난 나를 한 번 더 보시려고 그러셨단 말이지...
"어머님, 송구 할 따름입니다. 어머님의 아들과 다름 없이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전에 자주 찾아 뵙지 못한 것 용서하시구요,부디 영면하세요."
다시 집을 향해 돌아오는 길목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찬 목소리가 길가의 코스모스와 들국화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꿀사과 사이소! 밀양 얼음골 꿀사과 사이소!"
들꽃들을 헤집고 울려퍼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밀선(울산 밀양간 국도를 이렇게 부릅니다)을 타고 흩뿌려지며, 영남 알프스 골짜기를 타고 흘러 메아리로 되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내는 편한 세상으로 가니 걱정말고, 우야든동 느그덜은 우애있게 잘 살거래이."
===================.
박지윤의 내 눈에 슬픈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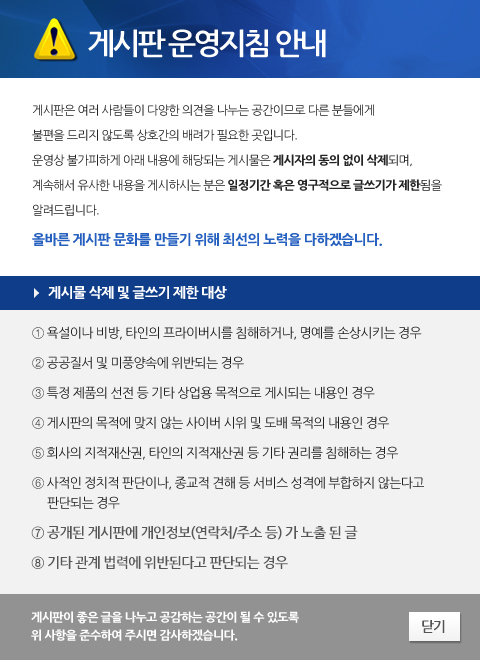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