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라고는 라디오 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에게 이글을 받칩니다.
오늘도 리어커 가득 과일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지나 나의 아버지는 칠순을 향해 갈지 자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닿아 버릴 것 같은 약수동 산꼭대기 동네는 아빠가 과일 괴짝과 씨름한지 어언 40년이란 세월이 되었지요.
자명종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는 내 아버지...
지금쯤 아버지는 귀마개와 마스크 또 뭘 챙기고 계실까?
남들은 스키 탈 때나 쓴다는 방수 장갑을 몇 번이고 꼬메시어 손에 끼고 계시겠지?
아빠의 인생만큼이나 낡아 버린 리어커의 이중 삼중 자물쇠란 허물을 벗기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도매 시장에서의 흥정을 연습하며 나가시겠지..
배 5짝, 사과 7짝, 귤은 몇 짝을 띠었을까?
글씨를 몰라 과일 괴짝 마다 박물 장수처럼 이상한 그림을 그려 놓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40년을 삼 남매 위해 살고 계셨습니다.
겉 보리 한 가마니에 살림을 나와 혈육 한 점 없는 서울에서 손에 베인 굳은 살 만큼이나 단단한 가정을 이루었다지만
엄마는 76년 10월에 위암으로 우리를 등지면서 아빠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멍애를 올려 놓고 가셨지요.
8살, 6살, 4살, 철없는 우리들은 빨간 쭈쭈바가 왜 그리 아빠보다 더 좋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체 커가고 있었답니다.
불혹의 나이에도 새치가 유난히 많으셨던 나의 아버지...
내 나이 10살이었던가요?
할아버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름길을 놔두고도 자식들이 등교하는 길을 피해 돌아 다녀셨던 내 아버지....
"지름길로 같이 다녀요. 아빠"
이 한마디가 그때는 왜 그리 입 속에서만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약수동 고갯길을 오르실 때마다 리어커 뒤에서 고사리들이 밀어주는 힘을 얼마나 그리워 하셨을까?
어쩌다 일요일이라도 되어 장사 따라 가자던 말이 나오면 (짐을 많이 실은 대목 밑)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면했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허망했을까?
내 나이 스무살이 되어 아빠가 떨어뜨린 땀방울을 밟으며 리어커를 밀 때 이 못난 딸은 비로서 느꼈답니다.
이 길에 아빠는 소리 없이 그 많은 땀을 땅에 떨어뜨리며 외롭게 리어커를 끌고 계시다는 것을요.
엄마의 투병생활에서 남긴 빛 잔치를 해 갈 무렵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고도
막내가 머리가 아프다며 눈앞이 아른 거리다고 했을 때 차마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다시피 했으니까
태휘가 군대를 가고 막내가 완전히 시력을 잃었을때 우리 가족 모두 막내와의 이별 연습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아빠 술만 드셨던 거 아세요?
한손에 젖병을 든 체 리어커에 걸터앉아 장사 따라다녔던 막내를 생각하면서 말예요. 라디오에 흘러 나오는 나훈아 씨의 노래 "물어 물어 찾아와서"를 간드라지게 하다가도 언던길이 나오면 내려와서 종종걸음으로 걸었던 우리 말내를요.
우리 막내.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서 속상했는데 속까지 깊었던 아이.
"내 수술비 벌려면 우리 아빠 복숭아 몇 짝을 팔아야 될까?"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지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세 장을 내 앞에 내밀던 아이였답니다.
아빠가 장사 간 사이.
언니인 나에게 한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저 세상으로 갔던 아이.
원이라도 없게 수술 한 번 해 준다는게 아빠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어 버린 계기가 되어
아빠는 오늘도 그 아이를 잊기 위해서 할머니 허리같이 굽은 그 고갯길에서
리어커를 굴리고 계신답니다.
우유 없이 먹는 빵처럼 팍팍한 그 길을 오르내리시고 어김없이 아버지는 또 김장김치에 멸치 몇 마리를 넣어 끓여 드시고 계시겠죠.
친정이 수 천리도 아니건만 자식 노릇 한다는 것이 왜 그리 힘드는 지요.
어쩌다 마른 반찬이라도 싸 들고 가는 날이면
"윤서방이 싫어라고 할텐데" 하시며 한없이 딸인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내 아버지!
이런 내 아버지를 두고 떠나오는 못난 딸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만치 서서 세워 있는 리어커의 바퀴를 몇 바퀴고 돌리고만 계십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주는 따뜻한 밥상을 드셔야 할텐데...
내가 흘린 땀이 아니면 거두지를 않는 성격으로 지금도 월세 방을 면치 못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누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을련지요?
홍경민의그대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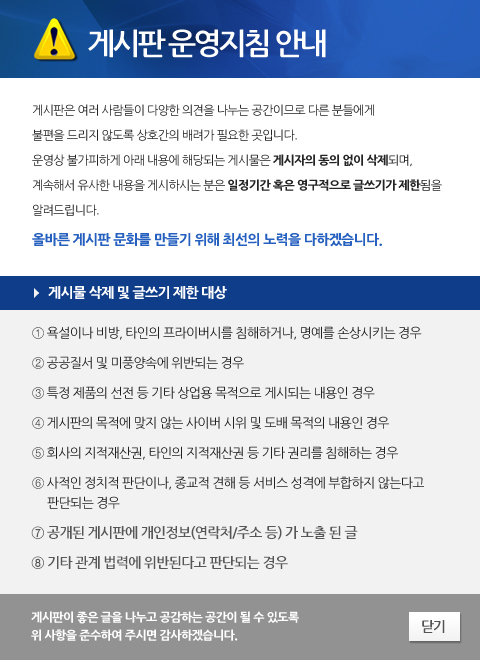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