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990년 춘삼월.
우와∼신난다. 드디어 우리만의 MT를 가는거야, 유후∼♪, 앗싸라비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시고 직사게 일만했던 ‘마의 연합MT’를 마친 뒤에 막바로 찾아온 여행이라 그 기쁨은 절정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무리들은 ‘MT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며 잘생긴 남자들 자취방만 골라서 방문, 여학생 기숙사 문 닫힐 시간까지 안들어가고 버티기를 수차례. 드디어 MT. 그날이 왔지요.
조를 짜는데 아 글쎄 여자애들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나은 영계 72년생 남자애 조에 당첨되면 화색 돌고, 69년생 조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면서 다른 조 기웃거리고, 원래는 70개띤데 너무 삭아보여 우리가 임의로 열 두살 추가시켜버린 58개띠 조의 구렁텅이에 빠진 여자애들은 집에 간다고 짐싸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르고 달래어 우리는 MT 전속메뉴 김치&참치찌개 만들면서 조별로 돌아다니고 맛을 보면서, 1조는 맛있는데 4조는 꽝이라는 둥 사소한 일에 함께 흥분도 하며 사뭇 들뜬 마음으로 MT를 즐기다가…
밤이 되어 우리는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이건 뭐야?’
커다란 방 한가운데 용도를 알 수 없는 문제(?!)의 칸막이 문들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이윽고 우리의 지도교수로 나타나신 춘식이오빠(그 당시 영문학과장이셨던 민춘식교수님. 우리는 그를 ‘춘식이오빠’라 불렀지요). 오빠를 맞이하여 경건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춘식이오빠는 오로지 음료수만 앞에 놓고 과자를 씹어대는 우리를 보며
‘이런 학번은 처음이야’ 내지는 ‘술이 있어야 맛이냐, 정말 건전하다’ 등의 찬사를 보내며 떠나셨습니다.
교수님도 별말씀을… 술이 있어야 맛이냐니요...
“야. 꺼내, 꺼내”
“거기 맥주 있지? 소주는 여기 있어∼”
술판은 벌어졌습니다.
“돌리고, 돌리고∼오!”
“소∼올소올소올 오솔길에 빨간 구두아가씨♬”
“아자! 우랄랄랄랄라밤바♪”
우리는 환상의 72년생의 18번 빨간구두아가씨와 58개띠의 라밤바를 안주삼아 마셔대며 그 나이에 너무나 잘 어울리던, 5천원 내고 단체로 맞춘 노랑색 영문과 티셔츠를 입고 영문인이 하나 됨을 느껴버렸지요. 떡발 좋은 58개띠는 옷이 짧아 배꼽이 보여도, 기타를 내리갈기며 마냥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옛노래를 불러도 72년생이 부르면 최신가요 같고, 아무리 광나는 팝송을 불러도 58개띠가 부르면 바∼로 상념에 잠기게 되는지…
새벽이 되어 하나 둘 이불을 펴자 불이 꺼지고 그 용도를 알 수 없던 칸막이 문이 닫혔습니다. ‘여자 남자 따로 자라고 그런건가?!’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모두 혼숙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입밖에 내지 앉고 골고루 섞어 누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자들과 누워있음에 흥분한 나머지 잠을 잘 수 없었고,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뒤척이는 순간…
정 중앙에 있던 칸막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웬 놈팽이 하나가 떡하니 서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남대문으로…
‘어머 어머, 뭐야∼, 이게 웬 떡이야’
제 눈알에서 나는 광채에 그가 놀랄까봐 저는 실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머∼ 지퍼 열었어. 장난 아니야. 이쯤에서 소릴 질러? 아냐 아냐, 이소영. 진정해라. 이럴수록 침착하게 지켜봐야징∼’
묘령의 그 놈팽이가 다음 동작을 취하려는 순간,
“으악!!!”
“어머머, 난 몰라!!!”
저와 뒤척이던 무리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를 질렀고 저도 뒤늦게 놀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긴 가렸는데 물론 손가락을 있는 대로 쫙 벌렸지요. 손가락 사이로 그의 에로틱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온몸이 불타올랐고, 그의 터프함에 완전 뻑이 간 저는 이 때를 놓칠세라 놈팽이의 중심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이예∼스. 너였구나. 그거야 그거. 자, 다음 동작. 액쎤∼!!!’
그러나…
우리들이 내지르는 소리에 놀란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흐느적거리는 그를 질질 끌고 밖으로사라져버렸습니다.
술이 떡이 된 그날 밤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그 칸막이 문을 그는,
그놈의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는 거 아닙니꺄!!!… #&☆※§◎♡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소리 지른거야? 더 봤어야 되는 건데’
다음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술이 안깨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수야, 난 니 팬티 하늘색인 거 못봤다.”
“영수야. 그러니까 말이지… 아무 문이나 기∼냥 열면 그게 화장실 문이 된다는… 그게 그거지? 맞아. 그거야.”
영수의 얼굴은 삽시간에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고 누가 누가 봤는지를 자세히 묻더니.
착하게 설거지도 하고 방도 열심히 치웠으나 다들 외면해 버렸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은 모두가, 그 광경을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릴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영수는 저희들과 함께 11년째 그날의 추억을 곱씹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하늘색 꿈을 안겨준 영수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저도 미래의 제 남편에게 꼭 때깔 고운 하늘색 팬티를 사주고 싶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영수야. 나 이뻐?
뚜띠의 Kiss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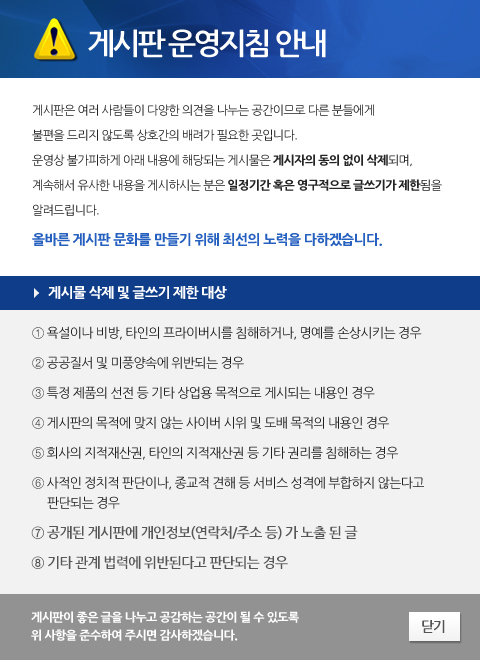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하늘색 꿈
박상연
2001.02.06
조회 24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