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란...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란 없었다.
나는 평범한 대학교 2학년이다.
평범한 키에 그리 예쁘지도 않은 얼굴, 그리고 남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
그러나 나를 평범하게 만들지 못하는 단 한가지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
51살, 이제는 인생의 석양에 바라볼 그녀의 나이
뺨아래까지 피어 있는 검버섯이 그녀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래 왔듯 좀체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어도, 엄마가 달래 주는 손길이 그리워 앙탈을 부려도
"어서 그치지 못해!"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마구 두들겨 주기만 했다.
언제나 그래 왔었다. 그녀의 격려는커녕 따스한 도시락 한번 받아본적 없었다.
방과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내릴 때면
행여나 감기에 걸릴 까 봐 복도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서 있는 아주머니들.
"경수야!" "민정아" 극성스럽게 불러 대는
그 아주머니 틈속을 헤치고 나는 운동장을 달렸다.
그렇게 빗속을 달려서 집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나를 반기는 거라곤
정적이 감도는 빈방과 덜 개어 있는 이부자리,
박박긁어서 두숫가락 나오는 밥통에 붙어 있는 밥알들과 총각김치 한 그릇이었다.
사실 그랬다. 우리 집이 남들처럼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어고,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원망
하면서 살아왔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인색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살아왔었던 것같다.
사실상 우리 집을 총 관리하는 사람은 지선 언니(큰언니) 였다.
아침 7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네모난 도시락 세 개 준비하는 지선 언니.
프랑크와 참치반찬을 내놓는 친구들 도시락 사이에서
나는 국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김치와 계란 후라 이를 미안하게 꺼내었다.
10월의 푸른 가을 하늘이 으레 다가오면 나의 가슴은 더욱 아파 왔다.
바야흐로 운동회 철이 다가온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혹은 고모, 이모들과 함께 운동장을 들어선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들 도란도란 자리를 잡고선 정성스레 싸 온 김밥이나 과일 등을 꺼낸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어쩌면 운동회는 어른들의 잔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내 주머니속 에는 2000원의 거금이 자리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루에서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2시간뿐이다.
밤10시가 되면 대문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 나는 엄마를 안보고 잘 때가 더 많았다.
아침이 밝아 오면 벌써 이불 속에 엄마는 없다. 집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엄마는 없다.
새벽 6시가 되면 엄만 집을 나선다.
썩은 내가 풍기는 구로 시장을 지나다 보면 아직도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간판들이 보인다.
엄마는 여관에 들어간다.
현관을 들어서자 마자 입구에 가득 쌓아 놓은 시트나 베겟잎등을 가지고 세탁실로 들어간다.
그렇다. 나의 어머니는 여관 파출부다.
그렇게 화장실청소까지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나면 여관일 은 끝이 난다.
일을 마치고 오후가 되어서 짬이 나면 집에 잠깐 들리거나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공장으로 간다.
그곳은 봉제 공장이다.
긴 옷감을 자르고, 재봉틀로 박고, 단추를 달고나면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온다.
여기서 일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다른 공장에 들러서 구두 밑창이나 인형 솜을 들고서야 집으로 향한다.
그러면 대충10시가 맞춰진다. 그러면 새벽까지 이것들을 마치고서야 잠이 든다.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남들은 농담도 잘한다며 서 웃어 버린다.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들여 마치는 공기와도 같이 그녀의 하루의 일과 였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 형편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살아 갈 수있다.
내가 4학년 때 아버지는 ''리비아''에서 사고로 숨을 거두셨다.
새벽에 내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곡소리 들리 길래 가 보았더니.
엄만 사진 한 장을 얼굴에 묻고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울다가 숨을 꺽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 뱉으면 서 말이다.
그때 처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창피했는지 행주로 얼굴을 닦았다.
엄마는 "빨리 가서 자."
하며 엉덩이를 들고서 일어섰다.
아마 나밖에 모를 것이다. 엄마가 처음 우는 모습을
나는 엄마가 아빠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아빠는 엄마를 자주 구타했었다.
그러다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한달 동안 안보인 적도 있었다.
''엄만 왜 병신같이 맞고만 사는 걸까? 우리한테는 엄하게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
엄만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이혼을 결심했다.
우리 네 형제와 아빠가 빚으로 날려 버린 집을 안고서 말이다.
엄마는 우리가족의 생계와 집을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리고 차차 빚을 갚아 가고 있을 때쯔음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들은 것이다.
어느 날 엄마는 우리 형제 모두에게 새 운동화, 새옷을 사주셨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다가 일어나 다시 상자를 열어서 운동화를 확인해보기도 했었다.
다음날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영환 실로 들어서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머니보고 왜 왔냐며 막아섰다.
이제는 인연이 끊어진 이혼녀가 그들에게는 남과도 같기 때문이다.
엄마의 부탁으로 겨우 우리만 아빠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었다.
큰언니, 둘째 언니는 아빠를 와치며 울었다.
그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던 나와 내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저 이 갑갑한 곳을 나오고만 싶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엄마는 우리 4형제를 눈물과 한숨 속에서 키워 오셨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교내 미술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나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봉제공장에 갔었다.
엄마를 기다린 지 얼마가 지나서야 엄마는 옷에 붙은 실밥을 털고서 나왔다.
"어머 정산아. 집에 무슨일 있어?"
나는 가방에서 자랑스럽게 상장을 꺼내어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만 30분만 기다리면 된다며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30분 보다 훨씬 더 지나서 엄만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다.
그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신이 났던 건 엄마 등에 내가 업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이었다. 엄마의 등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은.
"엄마. 내가 상장 받아 오니까 좋아."
"그럼. 우리 정산이 미술학원 안 다녀도 상도 받아 오고."
"정말?"
"그럼."
엄마는 잠시 말을 그쳤다. 그러다가 다시
"정산아."
"응?"
"정산아."
"엄마 왜."
''''어서 커. 빨리 자라야지 응?"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알았어 엄마 나 빨리 클게."
나는 그래서 결심을 했었다. 앞으로 상장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9년이 지난 지금, 요즘 엄만 각종 합병증으로 아파하신다.
이젠 내가 엄마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고 싶다.
내 마음의 구멍:강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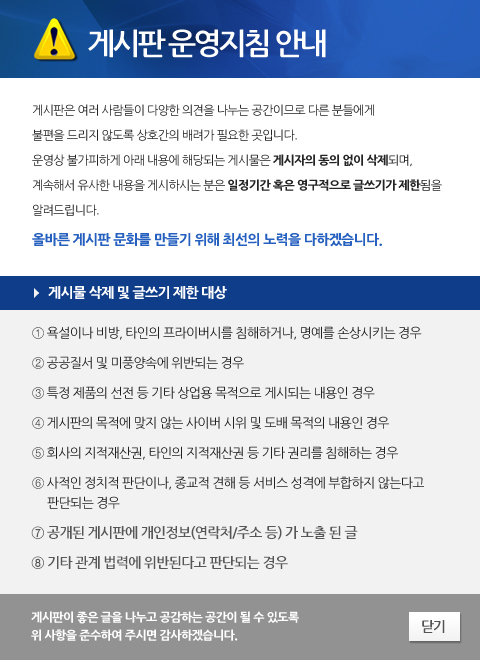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