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마흔이 지날려면 한달 조금 더 남았다.
내 또래 마흔의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과 아이들로 인하여 울고 웃으며 비슷 비슷한 삶을 살아왔지만
작년, 그러니까 묵은 천년을 보내는 다시 새천년을 맞이하는 나는 또다른 감회에 젖어야 했다.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민을 안고.
누구나 맞이 할 것같은 서른 아홉의 나이.
나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혹시나"하며
하루 하루를 떨며 살았는지 모른다.
내나이 스물 넷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들이 다하는 전셋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작으마한 물건들을 사 모으며 살림하는 맛을 배워 나갔다.
첫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까.
시부모님께서 가지신 재산을 처분하여 형제들에게 분배를 하시면서
우리부부에게도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
아이를 업은 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삿짐을 실은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저만치 떨어진 가계 앞에서 할머니 두분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손짓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여 이리와--봐"
두분중의 한할머니는 점쟁이 할머니였다.
평소에도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노후를 외롭게 보내시는
분이셨다. 소일하다시피 점을 쳐주고 용돈을 받아 쓰시는 분이셨다.
그분이 묻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것이었다.
"자네는 말이야,"
"네에 할머니"
"재복이 들었어"
"재복이라니요, 돈 말인가요?"
"그래, 그리고 남편 덕도 있고 자식 덕까지 있어"
"그래요?"
저는 저의 노후가 할머니의 예언대로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실로 좋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에다가 남편의 사랑까지, 그기다 자식들까지 잘된다는데 더 이상 무얼 바라겠습니까.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네에 할머니?"
"다만 명줄이 짧겠어. 생명줄 말이야"
저는 망치로 한대 얻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생명이 짧다는데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죠.
"할머니 그럼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서른 아홉, 아니면 마흔"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저는 물론 몇살까지냐고 물을 땐 농담하다시피 웃음은 띠었지만 마음속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여 뛸 듯이 기뻣는데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알지 모를 서운한 감정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까짓 점쟁이 말을 믿어 하시겠지만 일단 좋지 않은 말은 가슴에 새기는게 약한 자들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새 집으로 가서 한동안은 할머니의 말씀을 잊은 듯 살았습니다. 두아이 낳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불현듯 한번씩 떠 올랐지만 희미해지진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서른 아홉이 다 되어 갈 무렵부터 서서히 할머니의 말씀이 되살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집도 샀죠. 남편도 성실하지요, 아이들도 어리지만 착하게 잘 자라 주어서 할머니의 말씀이 기정 사실처럼 믿게 했습니다.
서른 여덟쯤에는 "내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타게 살 필요가 뭐 있나"하는 듯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 갔습니다. 다달이 붙던 적금도 의미가 없어지고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도 싫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봉급이었지만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로 궁핍한 생활은 아니었던것이 혹시 할머니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른 아홉의 정월 대보름.
저는 휘엉청 둥근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른 아홉에 저를 데려 가신다는 건
너무 하십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남편도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달에게 넋두리를 쏟아 놓기 시작하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얼 빌었는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느냐고 했고 저의 음성은 울음으로 인하여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희망으로 남겨 놓은 신의 지헤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면 누가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 가겠습니까.
청소를 하다가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기전에 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청소를 해놓고 죽었구나 하는 말들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혹시 모를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 놓고 살았구나 하는 질시를 받을것 같기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게로구나하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 하나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억누를려고 하니 더욱 아픈 가슴을 짓누를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겠죠.
"그까짓 점쟁이 말을 믿느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율법같이 가슴을 죄어 왔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마흔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묵은 날개를 벗어 버리듯 십 오육년을 괴롭혀 오던 말을 뿌리 뽑으려 합니다.
마음의 대청소를 하며 크나큰 기지개를 켜 볼까 합니다.
이제 우울을 마감하고 햇살 가득한 날을 맞을까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엔:봄여름가을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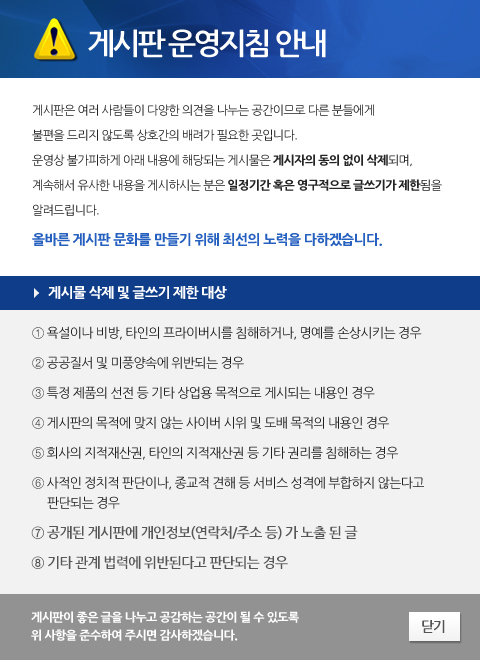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