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을 집어삼키는 900시간의 불길을 봄비가 물씬 두들겨주길 바랬는데 야속하게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저 산은 남의 일 인양 조용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전히 안개를 이불삼아 뒤집어쓰고 있네요.
저도 어릴 적에는 무서움이 나를 덮쳐버리기 전에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했었는데 말이죠.
얼마 못 가 숨이 막히면 훌러덩 들춰버리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구멍만 만들어 입을 바짝 대고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을 마중 나온 자신의 연두빛을 새침하게 뽐내더니 오늘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서운걸까요?
먼 동네 사는 산들이 불길에 부서져 가루되어날리는 것을 애써 모른 척 한 것은 어쩌면 무서워서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것이 미안해서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먼 동네 산이 온몸으로 품어 지켜낸 연두빛들이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양희은의 한계령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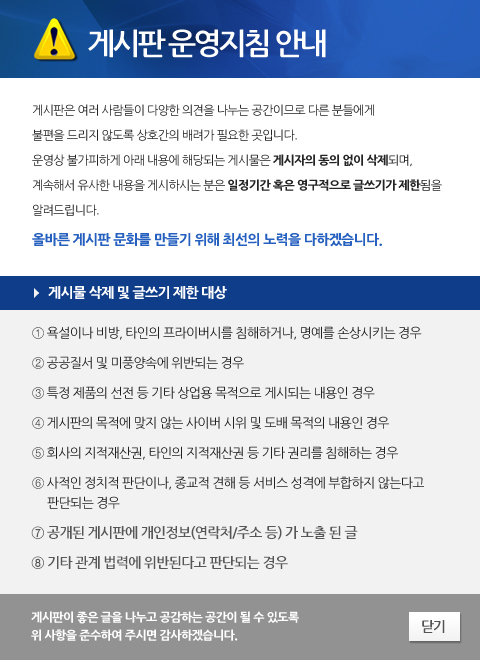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