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졌다고들 한다....
혹은,
별이 되었다고들 한다....
그가 죽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건 뭔가 좀 이상 하다.
어감도 느낌도 딱 들어맞질 않는다.
꼭 들어 맞아야 할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난 그가 '죽은 날' 당구를 치고 있었다.
밤 늦게까지 당구를 차고 들어와 늦은 아침에나
깨었고,아침도 점심도 아닌,
아내가 해주는 오징어볶음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전날 못본 최강야구를 핸드폰으로 보는데
뉴스에서 아주
짤막하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주 '짤막하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 ....?
지금 드는 이 억울함은 뭘까?
왜 먹먹하고 당장이라도 괴성을 지르며 울음이 터질것 같은걸까?
그러고 보니 어젯밤 늦게 집에 오면서 잠깐 그의 노래를 들었었다.
장마철이라 비는 간간히 오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창을 열어 놓았던터라
도로에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소음으로 항시 켜 두었던 라듸오에서 '아침이슬'이
왠일로(?) 그의 목소리로 흘러 나왔다.
쉰여덟....적지 않은 나이라 생각해 본다.
그 순간만큼은 그랬다.
찰나지만 세월을 느꼈다.
그립다. 그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싶다.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알고싶지 않다.
단지, 잘 살아있는지 알고싶다.
왜....잘 살아있는지가 궁금한지는 의문이다.
가봐야 할까?
서울대 병원인거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내가 거기를....
'학전'
그래 거기를 가는게 더 맞는거 같다.
그를 생각하면 고'김광석'씨가 떠 오른다.
다른 유명인들은 모르겠다.
난 오직 그만이 떠 오른다.
그 시절의 나는(다른 이들의 그 시절은 모르겠다)
그의 노래와 산과 바이크와
'희망이 있을거라는 절망'과
내 스스로 혹은 우리자신을 위로 했던거 같다.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렇게라도 해야 그의 대한 '예의'인 듯 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라도 그에대한
'예의'를 표해야만 한다.
'그 시절의 그'이기에....
이 낙서는 시간이 지나도 수정하고 싶지가 않다.
지금의 내 심정이 이렇게 어눌하고 질서없으며
지금의 우리내가 이렇게 어눌하고 질서없으며
지금의 우리내 역사가 이렇게 어눌하고 질서없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저 땅밑 깊이를 알수 없는 곳에서 말하는 듯 읖조리던
노래인지 시낭송인지....하던
바람에도 곧 스러질것 같던,
하지만 뭔가 아주 실낱같은 움찔함을 느끼게 했던
그의 목소리,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노래라 하고 싶지않다....
그의 이야기라고 하고 싶다.
그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그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꼭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김민기.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내생의 시간에 담습니다.
2024.7.22
오늘은
202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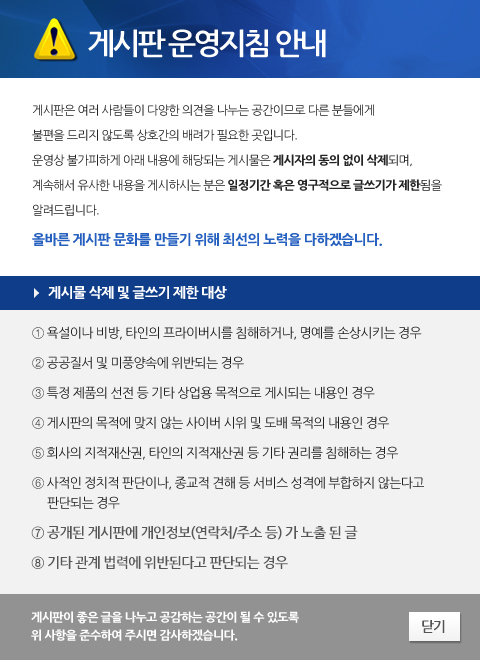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