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의 만남은 삼십년 만에 친구 엄마 회갑잔치에서 소설같이 만났다.
처음엔 매우 낯익은데 어디선가 분명 보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애지 역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서 시선을 뗄 줄 몰랐다.
나와 애지를 불러 막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동시에
“혹, 고향이..어디야?” 그랬다.
분명히 애지였다.
우리 집에서 비포장도로 징검다리를 건너 싸리꽃 향내로 가득 찬 곳에 애지의 집이 그림같이 항상 놓여 있었다.
애지를 안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따뜻한 어느 봄날 특별활동시간에 작문반에서였다.
작문반 선생님께서
“얘는 4학년이며 아빠가 면사무소 옆에 한약방을 차리게 되어 시내에서 전학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아이를 내 옆자리에 앉히셨다.
전학 온 애들이 으례껏 신고식을 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통과의례처럼 노래를 불렀다.
다른 아이들이 몸을 뒤틀거나 손톱을 물어뜯음으로 해서 시간을 축내다가 마지못해 주눅이 든 목소리로 아끼듯 부르다가 흐지부지하는 반면에 그 아이는 냉큼 일어나 가슴 가까이 두 손을 모아 쥐고는 발성이 잘 된 성악가처럼 잘도 불렀다.
그 애는 부끄러워 여자애와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다른 남자애들과는 달랐다.
기존의 애들이 먼저 애지의 눈에 들고싶어 했으며 그 아이와 짝꿍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몹시 부러워하는 애들도 생겨났다.
심술이 보통이 아닌 인철이가 그 애에게 말을 붙여보고 싶었던지 아니면 나와 짝꿍이 된 게 배가 아팠던지 불쑥
"아까 선생님이 너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송아지 할 때 아지..라 했던가? "
그러자 그 아이는 영순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난 사랑愛에 알智를 쓰는데 오빠는?."
영순인 밑천이 들통날까봐서인지 그 아이의 한문풀이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아이는 우리들과 다른 점이 많았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치 호롱불을 쓰다가 새마을 운동으로 알전구 전등을 켰을 때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잘해야 몇 가지 문구밖에 쓸 줄 모르던 나에게 있어서
"지구를 밀어 올리며" 올라온다는 그 아이의 강낭콩이란 시는 참으로 놀라웠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느날 애지가 특별활동 시간이 끝나고 자기집에 나를 초대했다.
"이건 형 공부방, 여기가 내 공부방.. "
나는 처음 듣는 공부방이라는 낯선 어휘에 어리둥절해하다가 책장 가득 꽂혀있는 책 앞에서 우리와는 달라보였던 모든 것의 해답이 그 책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이거 다 너의 책이냐?"
" 그으럼." " 나 봐도 돼?" 하니까
" 얼마든지.."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날부터 나는 그 애의 숙제를 도와주며 책을 같이 보았으며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지의 하아모니커 부는 모습에 반해 자주 찾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 아이의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심기가 불편해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빼꼼히 열려진 철대문안으로 들어 가다가 나는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 예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했거늘 느이들은 창피한줄 모르고 그렇게 붙어 있느냐, 앞으로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그러자 애지가 울먹이며 대꾸했다.
"엄마,같이 공부하고 책 보는데 뭐가 나빠?."
그 아이의 엄마가 무슨 말인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빌려갔던 ‘폴타크 영웅전’을 가만히 현관 앞에 내려놓고 애지의 집을 빠져 나왔다.
늦은 가을이라 온 몸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긴 제방을 걷는 동안, 이제 어두워서 잘 분간이 안되는 징검다리를 더듬어서 다 건너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줄줄 흘렀다.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얘야, 널 찾아 왔는가 아까부터 담장을 기웃거리는 남자애가 있다."
그 소릴 듣자마자 달려 나가보니 애지는 벌써 냇가를 건너고 있었으며 사립문에 곱게 포장하여 꽂아둔 책만 있었다.
불란서 시집과 알프스 소녀란 두 권의 책과 노란 은행잎에 깨알 같은 글을 써서 책갈피에 끼워진 편지였다.
“ 우리 서울로 이사 가게 됐어, 서울에 몫이 좋은 한약방이 나왔다나 봐, 서울에 가면 너 생각 많이 날거야, 널 좋아해, - 애지가 -“
한동안 책은 보지 않고 그 은행잎만 뚫어져라 응시를 하곤 했었다.
같이 건너던 징검다리만 가면 애지의 하하하대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여 많이도 걸어 갔었다.
그런 애지를 삼십년이 지난 후에 소설처럼 만나 시처럼 얘기를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때부터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고 내 삶의 변화가 시작 될 것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한강 둔치에 어깨를 기대고 앉아 하룻밤을 보낸 뒤 연락이 되질 않아 이 선생님에게 알아보니
"암과의 투병중이며 나한테 혹시 연락 오면 이민 갔다고 해라 했다며 알리지 않고 가게 되어 미안해하더라.." 전해주랬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랐다.
애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또 십년이 지났건만 나는 늘.. 찢어진 청바지에 하아모니커를 불던 그 머슴아가 그립고 그립다.
사랑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는가를 일러준 어린 날의 애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애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신청곡:이용복의 어린시절,이찬원의 시절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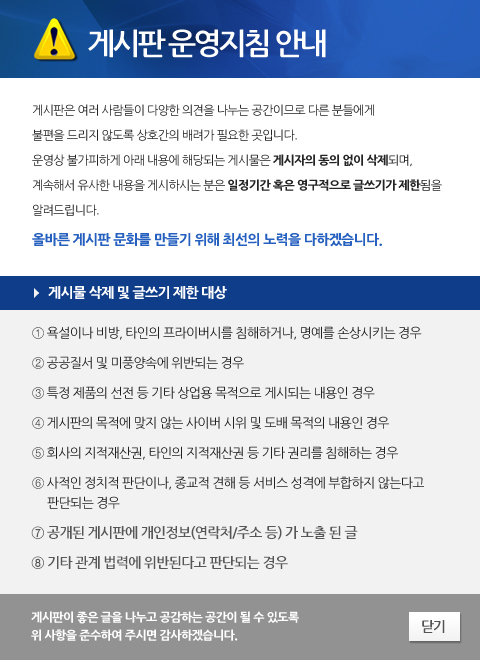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