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과수원이
우리 집에도 생겨났다.
먹거리가 귀했을 만큼 가난했기에 남의 집 과수원을 보며
꼴깍꼴깍 침을 삼킨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아버지께서는
"내자식에게 사과 만큼은 실컷 먹여야겠다."시며
이듬해 산밭에다 사과나무를 심으셨다.
다행히도 해를 거듭 할수록 탈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
금새 큰 나무가 되었다.
탐스런 사과를 해마다 주렁주렁 매달아 주어
식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서리가 내리고 추수철이 되면
부모님께선 사과나무 높은데 까지 오르셔서
사과를 따셨다.
그러면 난 사과를 담은 광주리를 받아 옮기는 일을 도맡아 했다.
부지런히 부모님을 도와드릴 마음에 쉬지않고
광주리를 날랐으니 팔이 빠질듯 아팠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일이니
그깟 팔 아픈것쯤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밤이되어 따땃한 이불속에 발을 묻고 누워 잠들라치면
쉬 잠이오질 않았다.
광주리를 들고 얼마나 부지런히 쫒아 다녔던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거 마시면 잠이 잘 올거야."시며
뜨끈한 설탕물을 건네주신 엄마덕에
거짓말 같이 금세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짚신장이 헌 짚신 신는다.' 했던가.
사과농사를 지으신우리 부모님 역시나
새들이 쪼아먹거나 병들어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을 골라 드셨다.
반질거리고 때깔 좋은 사과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돈 한푼 더 쥘수 있다든걸 왜 모르랴.
비좁은 사과나무 사이를 오가며
무거운 약대를 치켜들고 스무번 가까이나
힘들게 농약을 치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나질 않는다.
한 알의 탐스런 사과가 열리기 까지
온갖 정성을 쏟으시던 부모님이 무척이나 그립다.
이정옥 숨어우는 바람 소리
노사연 바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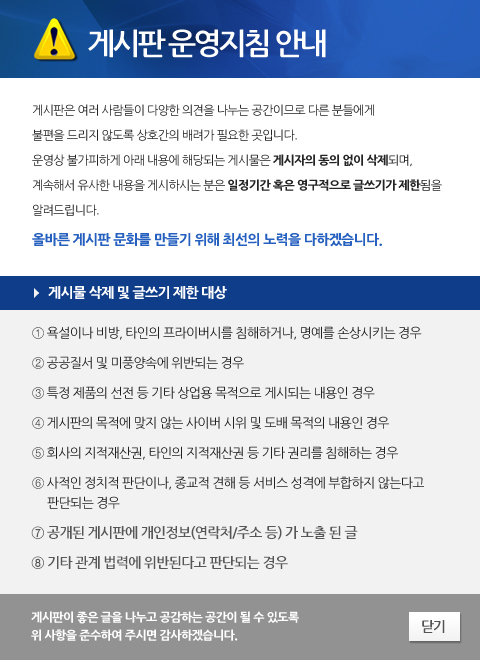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사과 한 알 따기 까지...
조영신
2020.11.22
조회 107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