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서둘러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이른 아침에 '누굴까!'
후다닥 현관문을 여니 이웃집 엄마다.
그저께 친정에서 캐온 것이라며 모락모락 김오르는 따끈한 고구마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수확하기 까지 보통 힘든일이 아닐텐데...'
고마운 마음 가득 맛있게 먹는 순간
문득 지난날의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른다.
어릴적 우리집에도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했다.
봄이되어 싹을 내어 무겁도록 머리에 이고 언덕배기를 오르시던 우리 엄마!
토지가 적은 우리 집을 배려해 언덕밭을 기꺼이 내주셨던 친척분의 고마운
마음을 헤아려 오신 엄마는, 해마다 그곳에 부지런히 고구마를 심으셨다.
칼날처럼 매서운 찬바람이 휘몰아치던 겨울 한 철
그 분 덕택에 떨어질날 없었던 고구마는
형편이 안좋은 우리 식구들에게 주식이나 다름 없었다.
뜨끈하게 군불을 지핀 할머니방 한가운데 떡하니 차지한
화롯불에 쉴틈없이 구워 내 살얼음낀 동치미 앞에두고
동생들과 머리 맞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시린 고사리 손을 호호불며 먹을때면 얼음장 처럼 언 몸을
사르르 녹게 해줄 만큼 고구마는 고마운 먹거리 였었다.
양식이 부족해서 허뎍이던 우리 식구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한 몫 톡톡히 할 만큼 소중했다.
멀건 우거지국에 꽁보리밥 한 덩이 말아 먹었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 배를 움켜 쥐어야 할때도 고구마는 좋은 에너지를 주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옹기종기 모인 야밤에도 역시나
달근한 고구마가 빠질 수 없었다.
소쿠리 수북히 쪄내 놓으면 게눈 감춰지듯 순식간에 사라지던
잊지못할 소중한 고구마가 아니었던가
어린시절 오붓이 한데모여 맛난 고구마를 먹으며
푸른꿈을 키워가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둘 다섯의 밤배
노사연 님 그림자
이정옥의 숨어우는 바람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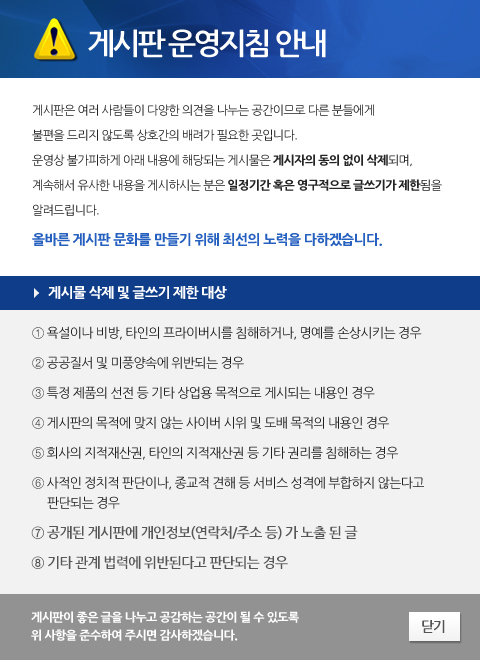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