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를 붙이며.2
여보 여기 파스 좀 붙여줘, 파스? 알았어
나는 돌아앉은 아내의 등에 좌표를 찾아 머뭇거리며
무심히 조심스레 손을 휘젓는다.
벌게진 파스 자국이 남은
등허리를 보고 멈칫하자
손이 왜 그렇게 차? 라고 되묻는 안지기.
원래 손이 차가워 라고 무심히 나는 얼버무린다.
응 그래도 너무 차내
여기 아니 조금 더 위로 그래 거기
윤기 잃은 덤덤한 등짝에 나는 하얀 파스를 색칠하듯
꾹꾹 눌러서 홍삼 냄새가 나는
파스를 정성껏 떨어지지 않게 붙여준다.
가진 거 없이 마흔한 살에 한 결혼.
10년 동안 한 이불을 덮었다.
아내의 영양분을 달게 빨아 먹고 버텼다.
내 뱃살과 눈주름은 늘어나고
아내의 빛나던 윤기는 사라지고 탁해지고 있다.
차가운 한 겨울밤에 파스를 붙이며 확인하는
삶의 저울질 할 수 없는 무게.
그렇게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삶, 결혼이란
안사람의 등을 보고 방황하며
파스를 꾹 눌러 붙여주고 잠시 가만히 어루만져 주는 것.
등, 등짝이란
동반자의 삶에 기둥이 되어주고 말없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약, 파스란
돌아누워 여기저기 붙여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우리 고단했던 하루에 대한
작은 위로와 응원이 담겨있는 가여운 만병통치약.
신청곡: 산다는 건 (김종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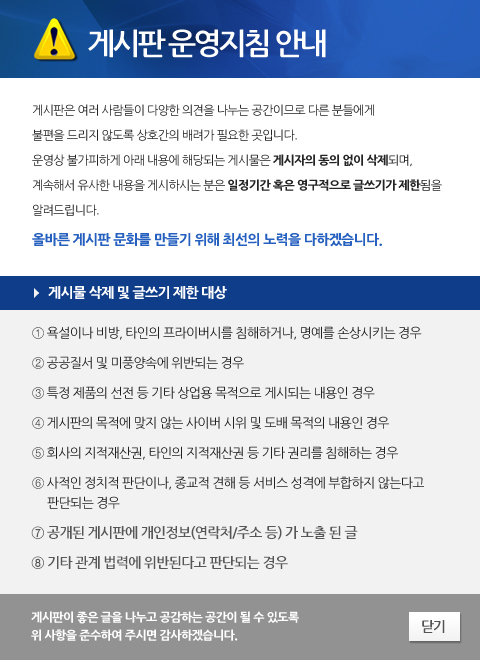
댓글
()